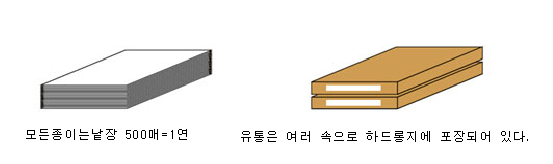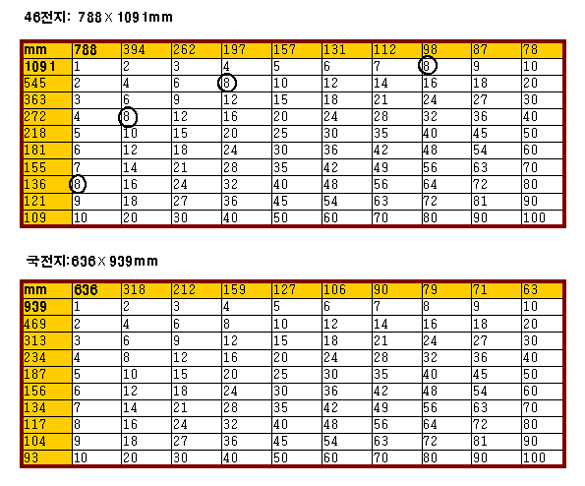종이 제대로 알기1
2003-06-22
::종이에 숨은 다섯가지 성질
하나. 평량 g/㎡
단위 1제곱미터당 무게를 나타내며 강도, 불투명도, 두께에 영향을 미칩니다.
각 단위별로 모든 종이가 그람수대로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트지는100g/㎡, 120g/㎡, 150g/㎡, 180g/㎡, 200g/㎡, 250g/㎡, 300g/㎡, 350g/㎡ 8종만 생산하고
백상지는 70g/㎡, 80g/㎡, 90g/㎡, 100g/㎡, 120g/㎡, 150g/㎡, 180g/㎡, 200g/㎡, 260g/㎡, 9종만 생산하고
화인코트지는 70g/㎡, 80g/㎡ 2종만 생산됩니다.
엠보싱지는 150g/㎡, 180g/㎡, 200g/㎡, 220g/㎡ 240g/㎡, 250g/㎡ 6종만 생산합니다.
이처럼 종이의 품질별 종류에 따라 생산되는 평량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 종류를 알아두시면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종이는 종류가 다양하지만 특수한 목적의 종이는 제한적으로 생산되고 때로는 주문 생산되고있는 편입니다.
둘. 두께 ㎛ (1㎛ = 1/1000 mm)
펄프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종이 가공시 calender의 압력이나 pressing 압력이 높을수록 얇아집니다.
종이의 불투명도과 밀도에 관련이 있고 인쇄뒷면 비침에도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가 두꺼우면 인쇄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두꺼워도 너무 얇아도 인쇄적성이 좋지 않습니다. 대개 100g~180g의 종이가 가장 인쇄적성이 좋다고 합니다.
평량이 무거울수록 두께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만 다른 종류의 종이와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모조지 100g과 아트지의 100g의 두께는 분명 다릅니다. 때에 따라선 수입지나 특수지 같은 경우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손으로 만져보아 두께를 구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넓은 면보다 좁은 면을 만져보는 것이 더욱 두껍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간혹 작은 샘플만으로 두꺼운 줄 알고 인쇄하였다가 생각보다 얇게 인쇄되었을 때가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그 변수를 줄이기 위해 인쇄되어 나올 크기의 종이를 샘플로 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책이나 결과물에서는 평량보다 두께로 그 제품의 품격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평량과 두께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종이의 두께는 평량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 더 두께의 관계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 밀도
종이의 부피에 대한 무게를 나타냅니다.
섬유소의 결합정도, 카렌다의 압력정도, 종이의 불투명도와 관련이 있어 인쇄뒷면 비침에도 큰 영향이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종이에서 같은 평량과 두께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낮아져 그람수를 높여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몇 년 전에는 120g종이를 이용한 인쇄물도 최근에는 150g종이를 사용해야 같은 밀도와 볼륨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넷. 수분
종이에는 약7~8%의 수분이 함유되어있다.
제품의 특성 및 강도, 무게와 밀도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종이의 팽창과 신축 그리고 컬 등 종이의 결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다섯. 회분
종이에 활석 등 광물질 함유 정도를 나타내고 백상지의 경우는 10~20%가 된다.
이 광물질 등은 인쇄시 블랑켓의 마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여섯. 표면성-평활도
종이 표면의 특성을 나타내고 압력을 가했을 때 공기의 유동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주로 종이 표면의 거칠고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인쇄망점의 재현성과 인쇄결과물의 느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 투기도
종이에 공기가 투과되는 정도. 밀도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식품이나 약품의 포장지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종이를 구분하는 다섯가지 요소
brightness, whiteness, gloss, opacity, smooth
밝기(brightness) -백색도
종이의 흰빛에 의한 밝기로 종이제조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흰색의 정도(whiteness) -백감도
눈으로 희게 느끼는 정도. - art지와 snow white지의 차이에서 알 수 있습니다.
회색계통의 흰색, 푸른색계통의 흰색 미색계통의 흰색 등 같은 백색아트지라 하더라도 제조사별로 동시에 살펴보면 백색이 주는 느낌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미색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종이는 같은 색으로 부르더라도 제조사별로 다른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백색이 주는 정도의 차이를 예민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합니다.
때에 따라선 같은 제조사안에서라도 생산되었던 시기별로 색의 농도가 다른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예로 단행본의 경우 초판의 종이와 재판의 종이를 비교하면 조금씩 다르다는 겻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쇄할 때에는 한가지의 일에 대해선 종이를 한꺼번에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양이라 하더라도 다른 제조사의 종이와 함께 섞어 주문해선 안 되고 동일한 제조사라도 같은 시기에 생산한 제품으로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같은 예는 옷감의 제조원단 경우에서도 쉽게 사례를 찾아볼 수 있죠!
좋은 제조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 차이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좋은 제품의 질을 변하지않게 항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훌륭한 기업정신이 아닐까요?
가끔 같은 책에서 조금씩 다른 색의 종이가 어줍지않게 섞여 인쇄되고 제본된 것을 보면 흰색의 정도를 뚜렷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광택(gloss)
종이 표면에 광선이 반사되는 정도.
광택도가 높은 인쇄용지는 눈의 피로를 가져옵니다.
길에 붙을 포스터나 벽에 걸어둘 달력은 광택이 높은 아트지보다 광택도가 높지 않은 종이(snow white지)로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투명(opacity)
광선이 종이에 투과되지 않는 정도.
뒷면에 인쇄하는 종이의 경우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정보의 양이 많거나 뒷면사진이 크게 들어가는 인쇄물, 가독성이 높은 인쇄물일 경우는 불투명도에 신경을 써야합니다.
평활도(smooth)
평평하고 매끄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전반적인 인쇄물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므로 디자인의 특성에 맞는 평활도를 결정해야합니다.
::종이의 거래 단위 = 연, 포장 단위 = 속
종이는 연과 속으로 구분하여 단위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연을 종이의 거래하는 단위로 1연(Ream, 漣)= 500매를 기준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 1250장이 필요하다면 2연 250매로 부르게 됩니다.
속은 종이를 운반하기 쉽게 포장한 단위입니다.
종이의 무게와 두께에 따라 사람이 운반하기 쉽게 포장되어있는 셈이지요. 무게가 무거울수록(평량이 높을수록=g/m) 1연당 속수가 많아집니다. 100g짜리 1연이 2속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200g짜리 1연은 4속으로 포장되어있음을 말합니다.
인쇄소나 충무로 골목을 가다보면 삼발이(좀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바퀴를 세개 달아 개조한 오토바이)나 오토바이 뒤에 흔히 누런 하드롱 포장지에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런 포장단위가 속입니다.
::종이의 규격-매엽지, 두루마리지
인쇄용지는 매엽지(sheet)-낱장으로 재단되어 포장된 종이-와, 두루마리지(roll)-종이의 폭을 기준으로 두루마리형식의 종이- 두 가지 형태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매엽지-쉬트지는 낱장으로 일반적인 옵셋인쇄용으로 생산되는 것을 말하고 롤지는 윤전인쇄기를 위해 생산되는 용지 즉, 신문용지를 말합니다.
종이는 판형이나 규격에 맞춰 주문되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쉬트지로 일반 옵셋인쇄용 종이의 정규규격은 크게 46전지(788x1091mm)와 국전지(636x939mm) 크게 두 가지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A열지(625x880mm), B열지(765x1085mm) 하드롱지(900x1200mm)가 생산되고있으나 A지나, B지는 국제규격이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쇄용으로는 잘 사용하지 않으며 하드롱지는 주로 포장용지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이조견표입니다.
일반종이 외에 수입지의 경우에는 종이의 규격이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므로 크기를 고려하여 종이를 선택해야합니다. 더군다나 종이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손실률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종이의 규격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조견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같은 8절이라도 절수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4종류의 크기가 다른 종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변형으로 나누었을 경우는 조견표에 나오지 않는 절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시한 방법외에도 얼마든지 절수 나누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번거롭더라도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절수를 나누고 계산하여 조견표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