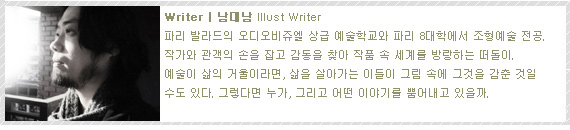빛에서 다가서는 방랑자, 잠산②
2011-06-15
전편에서 평작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던 '헨젤과 그레텔'은 사실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보기 드문 수준의 수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준급의 완성도를 가지고도 어째서 그 그림은 내 눈 앞에서 '잘해야 범작' 수준에 머물러야만 했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다. 나는 이 작가가 그린 '늪거인'이라는 작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글 | 남대남 일러스트라이터( statchs@hotmail.com)
에디터 | 이은정(ejlee@jungle.co.kr)
앞 글에서 나는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한 작가라면 그가 무엇을 그리던 간에, 그는 결국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 즉 자기 자신을 붓에 묻혀 그릴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었다. 나는 스스로를 조금씩 덜어 그 파편을 붓에 묻히고, 여러 번의 붓질을 통하여 자기 자신(=세계관)을 작품에 투영함으로써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내는 사람들이야말로 작가들이라고 생각하기에, 작품의 호불호를 아래의 기준에 맞추어 매겨왔었다.
1. 자기 자신을 얼마나 치열하게 그림 위에 투영하려 들었는가.
2. 그렇게 투영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타인들에게 얼마나 온전하게 드러나 보일 수 있는가.
3. 투영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이 얼마나 타인들에게 공감과 호응을 얻을 수 있는가.
많은 작가들은 그림 위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 정도는 일정 수준의 그림 스킬을 얻은 후라면 자연스레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언하곤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각종 스킬들은 이미 그 전에 마스터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닌 것 같은가? 만약 당신들이 창작을 하기 위해 선배의 조언을 구해 보았다면 한번 이상은 다들 들어봤으리라.
" 많이 그리다 보면 다 돼! "
" 많이 쓰다 보면 다 돼! "
" 목청이 터지도록 부르면 다 돼! "
하지만 미안하게도, 그건 착각이다. 단 한 번도 가난하지 못했던 재벌집 장남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울 수 없듯이, 실제로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을 단 한번도 잃어보지 못한 자에게는 그렇지 못한 자가 조언을 구할 수 없다. 소더비 경매장에서 고가에 낙찰되었던 그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는데, 사실 그것도 별 것은 아니다. 침팬지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투영해 내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던 것뿐이다.
코미디라면 그걸 자기 자신의 감정과 동조하여 박수를 보내고 억만금을 쏟아 부었던 사람들이 한 것이지, 바나나 두 개에 영혼을 팔고 마음껏 붓을 휘둘렀던 침팬지야 무슨 죄가 있겠나.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본 사람이라면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려 들기 마련’이다. 미술학원에서 가르쳐주는 정물화나 석고 데생 등은 소위 말하는 ‘기본’이라는 테두리는 눈 앞에 보이는 사물의 정형화된 형태를 손과 뇌에 각인시킨다.
이러한 교육을 거친 사람들은 속칭 ‘그림을 잘 그리는 녀석들’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뒤를 따르는 그렇지 않은 이들은 자신들도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려 든다.
하지만 이건 유일한 길이 아니다. 그림이란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이는 대로 그린다면 아무리 백날 열심히 그려봐야 결코 핸드폰 직찍 수준을 넘길 수 없다. 모름지기 그림이란 ‘느끼는 대로 그리는 것’이다.
심지어 그게 침팬지였다 하더라도 작가가 느낀 그 무언가가 온전히 그림에 드러날 때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바로 그러하기에 한계에 봉착한 수많은 작가들이 자신들이 그 동안 익혀왔던 ‘사물을 정형화하는 기술’을 파괴하면 느낌 대로 붓을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얄팍한 기대심리로 데생을 파괴하기 위해 기를 쓰는 것이다.
어떻게 했던 간에 천신만고 끝에 스스로의 느낌을 그림에 드러낼 수 있는 수준(경지)까지 이르렀다고 하자. 이젠 또 다른 차원의 벽이 가로막는다.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처럼 느껴지는 이 벽은 바로 가치관의 벽이다.
그림에 드러나는 작가의 느낌이란 것은 한 순간에 전광석화처럼 스쳐간 깨달음일 수도 있고, 오랜 세월 동안 갈고 다듬었던 작가적 인생의 고뇌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그것의 깊이에 따라 우리의 감동이 가지는 깊이가 달라진다.
작가 잠산의 늪거인은 한 풀만 벗겨보면 알 수 있듯이, 자화상이다. 그는 누구나 죽는 바로 그 순간 얼굴에 띄우고 싶어할 만한 부드러운 미소를 띄우고 있다. 머리에 쓰고 있는 지붕이나, 한쪽 몸체를 비껴 올라가는 계단 같은 것들은 오로지 그 미소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소품적 장치일 뿐, 모든 것은 화면의 절반을 점령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만끽하는 거인의 미소와 저 푸근하기 짝이 없는 길고 북실거리는 털들에 맞추어져 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그림을 그리는 순간. 즉 2006년 6월의 작가 잠산은 다정하고도 부드러운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다. 사회 속에서 돈을 벌어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 왔던 간에, 그가 필사적으로 지켜내고 싶었던 인생의 가치는 소박하리만큼 조그만 미소였으리라.
그는 자신을 온전히 열어 드러냈고, 나는 그의 미소에 매료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 지 모르지만 이 작품은 어느 관객 하나가 그토록 지켜가고 싶었던 그 가치를 그림의 주제. 즉 작가 자신의 가치와 완벽하게 동조시켜 낸 작품이었고, 따라서 이것은 내가 기억하는 명작의 반열에 충분히 들 수 있을 것이다.